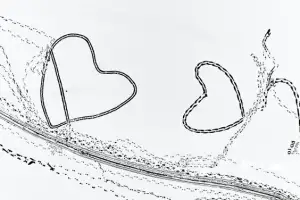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데스크칼럼] 外資 유치의 함정
기자
수정 2002-06-17 00:00
입력 2002-06-17 00:00
K씨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소송을 하게 된 사연은 대충 이렇다.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회사를 일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단에서 오너의 주식을 감자,경영권을 빼앗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K씨의 더 큰 울분은 다른 데 있다.외화유치라는 명분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대한 섭섭함이다.
외국계 회사가 투자한다면 채권단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고분고분하면서 자신이 부탁을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든가,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실무자가 하소연한다는 것이다.
K씨가 경영했던 회사는 최근 일본 굴지의 회사에서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채권단에서 환영한다는 문구도 들어 있었다. K씨로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물론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다.유동성 확보실패 등 위기에 대한예측경영을 하지 못한 잘못은 누구를 탓할 입장이 못된다.
그러나 그는 외국계 회사에 주어지는 혜택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일시적인 자금난을 경영실패로 몰아세워 경영권을 빼앗은 일은 해도 너무했다는 것이 K씨의 주장이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국내 4대 재벌이던 회사가 공중분해됐는가 하면 한때 재계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던 기업들이 소리없이 쓰러졌다.그중에는 대표의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도 분명히 있다.차입경영으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다가 직격탄을 맞은 기업인들도 한둘이 아니다.
여기서 K씨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외국자본에 대한 검증 작업이다.한때 우리 사회에선 외자를 유치하는 사람은 무조건 애국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정부 당국자들도 외자라면 사족을 못썼다.당시의 절박한 심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1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고,무역수지도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채권단이나 정부당국의 인식은 IMF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워크아웃 중인 기업을 매입할 때도 내국인 단독보다 외국계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
외국계 자본들은 이러한 국내 현실을 너무 잘 꿰뚫고 있다.계약금만 들여놓고 나머지는 국내 은행에서 차입을 일으켜 충당하거나,아니면 이름만 빌려주고 실리를 챙기는 외국계 회사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본 기업에 넘어간 K화학 역시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전주는 내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나 정부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외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여야 한다.IMF의 절박한 시절에 취했던 조급한 정책들을 추스르고,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시점이다.
홍성추/ 기획취재팀장
2002-06-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