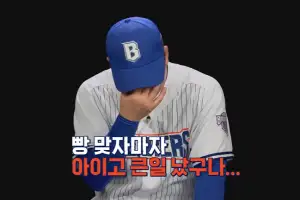2001 길섶에서/ 호박넝쿨
기자
수정 2001-11-09 00:00
입력 2001-11-09 00:00
출근 길,아슬아슬하게 매달린 호박을 발견한 것은 추석 무렵이었다.옹색한 곳에 자리잡았다가 바람에 나무가 심하게 흔들려서인지,아니면 자신의 무게 때문에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매달려있는 품새가 금방이라도 툭 떨어질 것처럼 불안해 보였다.그러나 한달 남짓 지난 뒤,이파리들이 누렇게 말라버리고 호박을 붙들고 있는 넝쿨도 까실까실 탄력이라곤 없어 보이지만 호박은떨어질 것 같지 않다.눈에 익숙해진 탓인지 오히려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굳어 그대로 화석이 돼버린 것같은 호박넝쿨을 보면서 마지막 남은 치약을 짤 때 대학 다니는 손주보다 훨씬 힘이 세신 어머니의 손 힘을 떠올려 본다.그렇다.저 질긴 힘 속에 세상이 유지되는 비밀이 있다.
김재성 논설위원
2001-11-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