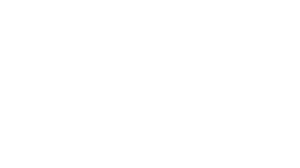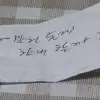올해 회갑맞는 연출가 오태석씨
기자
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연습중인 작품은 그의 초기작인 ‘태(胎)’.올해 50주년인 국립극단이 역대공연작 185편가운데 평론가,연극인,관객들의 의견을 참고해 우수레퍼토리로선정한 작품으로,4월1∼9일 국립극장 대극장(02-2274-1172)공연을 앞두고 있다.74년 초연된 ‘태’는 우리 전통의 소리와 몸짓을 토대로 한 한국적 무대양식,세조의 왕위찬탈이라는 역사적 소재를 통해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이끌어낸 탁월한 주제의식 등으로 3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국립극단이 지난 반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태’를 선택한 것도 이 작품이 지닌 우리식 연극문법과생명의 원천에 대한 작가의 경외심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생명복제다 뭐다 해서 인명이 경시되는 요즘 보다 근원적인 생명의 실체와 의미를 보여주고자 합니다”이번 공연은 회갑을 맞은 오태석의 올해 첫 무대이기도 하다.37년이라는 녹록치않은 연극인생을 걸어오고도 여전히 소년같은 호기심과 청년의 열정을간직한 그로서는 그닥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순(耳順)’에 접어든 그의 작품세계에 거는 연극계의 기대는 남다르다.“글쎄요,어영부영하다보니여기까지 왔네요.아직 철도 안들었는데…”쑥스러운 웃음으로 말꼬리를 흐리는 그의 입가에는 연극만을 외길삼아 살아온 천상 연극쟁이로서의 고집과 자부심이 묻어난다.
연세대 철학과 재학중이던 63년 연희극예술연구회에 막잡이로 들어가 처음연극과 인연을 맺은 그는 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웨딩드레스’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극작가와 연출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83년 창단한 극단목화는 서양 연극의 문법에서 벗어나 3·4조 또는 4·4조의 구어체에다 마당극 등 전통적인 놀이의 형식을 빌려 질박한 우리 정서를 표출하는 ‘오태석식 연극’의 산실역할을 해왔다.‘심청이는 왜 두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백마강 달밤에’등을 비롯한 그의 모든 작품에서 보여지는 비약과 생략,초논리적 유희 등은 오태석 연극을 특징짓는 주된 기호들이다.
우리 고유의 정서와 역사 재해석에 초점을 맞춘 그의 작품들이 요즘 젊은 세대 입맛에 맞을까 싶은데 지난해 5월 대학로에 전용극장(아룽구지소극장)을세우면서 기획한 ‘오태석연극제Ⅱ’의 결과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지난 2월까지 장장 10개월간 계속된 연극제기간에는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대학로를 떠났다가 5년만에 되돌아와 내심 초조했던 오태석은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했다”고 만족해했다.
‘극이 해학을 놓쳐서는 안된다’‘목에 힘주지않고 관객들을 풀어주는게 내 연극’이라는 오태석의 말속에는 동시대의 젊은이들과 호흡하려는 노장 연출가의 치밀한 자기단련이 숨어있다.오태석은 올 11월 런던무대에 진출한다.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는 여러차례공연했지만 영국은 처음이다.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춘풍의 처’와 ‘부자유친’을 공연할 예정이다.지난해 한국유학생이 ‘태’를 런던 소극장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은 덕에 현지 언론이벌써부터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국내에서는 4월29일부터 고향인 충남·대전지역에서 ‘오태석연극제’가 기획돼있어 그에겐 어느해보다 바쁜 한해가 될 것같다.
이순녀기자 coral@
2000-03-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