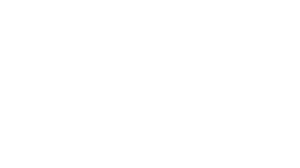연극/무대 양적팽창·작품 기대이하(한국문화 50년:7)
기자
수정 1998-08-24 00:00
입력 1998-08-24 00:00
건국 당시 우익진영 연극인들이 모인 극예술협회가 고작이던 한국 연극계는 현재 서울에만 극장 50여곳,한국연극협회에 등록된 극단 수만 99개로 양적 팽창을 이뤘다. 그러나 이같은 연극의 대중화 추세는 상업주의,선정주의 물살에 떠밀려 과거보다 오히려 연극정신과 방법론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수립 직후 우리 공연예술계는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속에서 반쪽짜리 예술로 출발했고 연극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50년 4월29일 연극인의 숙원이던 명동 국립극장이 문을 열었으나 개관한지 58일만에 6·25를 맞았다. 전쟁후 폐허와 가난속의 우리 연극은 그나마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힘겹게 맥을 이어오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드라마센터와 실험·민중극장 등이 생겨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50,60년대 우리 연극계는 명동을 중심으로한 이른바 ‘명동시대’를 구가했다.
69년 국내최초의 살롱무대인 카페 떼아뜨르가 충무로에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소극장시대’를열었다. 명동시대를 주도했던 예술극장이 75년 매각되고 연극인들의 무대가 좁아지자 이같은 경향은 더욱 거세졌다. 삼일로창고극장,실험극장,민예소극장 등이 소극장 부흥에 한몫을 했다. 실험과 도전정신이 반짝거린 한국 연극의 중흥기였다.
80년대 연극계의 최대 이슈는 역시 표현의 자유와 검열문제. 84년 정치비판을 담았던 연우무대의 ‘나의 살던 고향은’이 심사대본과 공연대본이 다르다는 이유로 6개월간 공연정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이 시기는 81년 12월 극장허가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연법 제정으로 한국연극계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룬 시기이기도 하다.
81년 동숭동 문예회관 개관과 함께 막을 올린 ‘대학로 연극’은 90년대 들어 가속화됐다. 사회 전반의 해빙무드와 개방물결은 연극계에도 과거의 이념적 대립이 해소된,자율과 개성시대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상업화에 쫓겨 함량미달 공연이 늘어 오히려 작품수준은 낮아졌다. 지난해 제1회 세계연극제와 몇몇 극단들의 해외공연으로 일기 시작한 세계화바람도 IMF 영향으로 주춤한 실정이다.<李炯美 기자 hyungmee@seoul.co.kr>
1998-08-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