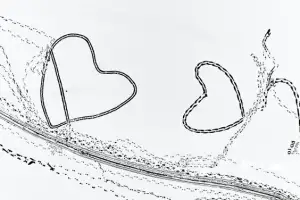살아남은 이가 할 일(任英淑 칼럼)
기자
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육권을 빼앗겨 아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해고된 사실을 아내에게 감추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 등이 영화 ‘풀 몬티’의 주인공들이다.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남성 스트립쇼단을 조직하고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인 공연을 갖는다.그 과정은 배꼽 잡게 하는 코미디의 연속이다.그러나 영화가 끝난 후 경쾌하게 일어서는 젊은 관객들속에 곧바로 합류해 영화관 문을 나설 수 없었다.충혈된 눈을 들킬까 겁나서였다.웃음 속에 숨겨진 주제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상황에서 위선(옷)을 벗어 던짐으로써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질 수 있다가 감동적이긴 했다.그러나 나를 울린 것은 이 영화를 보았을 실직자들의 마음이었다.그 영화를 보도록 권유한 사람은 실직한 옛 동료였다.그는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3백원의 행복’은80년대 영국을 무대로 한 ‘풀 몬티’보다 더 직접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다.중산층의 삶을 살다가 하루 아침에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펄로 변해 서 있을 수도,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는 현실”에 처한 실직가정의 참담한 모습을 보여준다.신문 끊고,우유 끊고,학습지 끊고,시장 가는 발걸음 끊고,모임도 끊고 살면서,중학생 아들 급식비 마련을 위해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지고 온 집안의 책갈피란 책갈피는 다 뒤지고,결국 친지란 친지에겐 다 도움을 청하게 되고,집에 있어도 외딴 섬에 홀로 앉아있는 것 같은….
실업자가 벌써 200만명을 넘어 섰다고 한다.실업자 한 사람이 평균 4인 가족을 부양한다고 보면 우리 국민 6명중 1명이 실직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실업은 이제 더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정부가 갖가지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종교·시민단체들이 나서 실업자 구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실직자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할 듯 싶다.
영화 ‘풀 몬티’의 한 주인공 롬퍼는 자신의 자살 기도를 막은 가즈와 데이브가 “우린 친구야”라고 말하자 무표정하던 얼굴에 비로소 웃음을 띤다.‘3백원의 행복’의 저자 윤지원 주부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고 말한다.지난해 직장을 그만둔 한 친지는 ‘살아 남은 자의 도덕적 의무’로 전화하기,밥사주기,격려하기,일자리 찾아주기 등을 들었다.그는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라면서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는 전화라도 가끔 하는 이들이 참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살아 남은 이들도 불안하긴 하다.정리해고로 인원이 줄어 들어 업무량이 두배 이상 늘어나 허구한 날 야근에 휴일도 반납하고 상여금은 없어졌고 봉급도 깎였다.
그래도 누구하나 불평도 못하고 동료끼리 경쟁자가 돼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일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아직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실업자들보다는 휠씬 나은 형편이다.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미덕이다.우리 옛 어른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기름진 냄새 풍기는 것조차 삼갔다.실직자가 “완전히 버려진 느낌”을 갖지 않도록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가 파국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1998-05-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