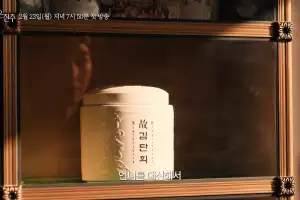미국에 역사소설 바람
기자
수정 1998-05-04 00:00
입력 1998-05-04 00:00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최근 미국에 역사소설 붐이 일고 있다.
어느 나라나 현재가 아닌 지나간 과거를 무대로 삼거나 잘 알려진 과거사를 소재로 하는 소설이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린다.미국의 대히트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뿌리’도 역사소설이지만 미국도 역시 딴 나라들에서 처럼 대개의 역사소설은 익히 알려진 과거사를 재탕삼탕 ‘쥐어짜는’ 데 그쳐 역사인식이나 소설적 격식이 그다지 높지 않다.
대신 미국에서는 플리쳐 상이 증명해주듯 역사 넌픽션과 전기 문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그런데 최근 소재가 쓰기 쉬워 고른 역사소설이 아니라 소설적 형상화의 방편으로 역사를 택한 격조있는 역사소설이 동시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위크 지는 주목하고 있다.
뉴스위크가 거명한 소설가들은 워낙 예전부터 소설적 자존심이 ‘센’ 작가들이라 최근의 동시출간을 아류가 범람하는 유행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보다 심층적인 이유가 있다고 뉴스위크는 말한다.그렇더라도 지난해 하드커버로 1백60만부가 팔린 찰스 프레이져의 ‘추운 산’을 이런 붐의 엔진으로 꼽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무명작가의 첫 소설인 이 작품은 남북전쟁을 소재로 했다.지난해에는 이 작품 말고도 헤비급 역사소설이 여럿 있다.플리쳐 수상작가인 돈 드릴로의 ‘지하세계’는 미국의 냉전시대를 조람한 것인데 마지막까지 ‘추운 산’과 내셔널 북 상을 다투가 밀려났었다.미국에서 가장 현대적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발표하고도 밖에 얼굴을 내밀지 않아말 그대로 가장 신비한 작가인 토머스 핀천은 독립전쟁 무렵이 시간대인 ‘메이슨과 딕슨’을 발표했었다.
올 봄엔 중량급 작가들의 역사소설이 ‘억수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말한다.엘모어 레오나드의 ‘자유 쿠바’는 19세기 후반의 미·스페인 전쟁을 다루고 있고 T.C. 보일의 ‘쪼개진 바위’는 금세기 초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백만장자 아들 이야기로 그의 정신병적인 성적 행태와 환상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조명하고 있다.
놀라운 박람강기에다 현학적 문체로 유명한 고어 바이들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된 역대 미 대통령 납인형들이 밤만 되면 되살아나 13살짜리 소년에겐 역사적 사건들을 다른 식으로 전개해 보여주는 환상적인 ‘스미소니언 협회’를 냈다.러셀 뱅크스는 남북전쟁 1년전에 흑인 노예의 반란을 기도하다 처형당한 열렬한 노예폐지론자 존 브라운을 주인공으로 7백매가 넘는‘구름을 가르는 사람’을 썼다.
이밖에도 올 봄에 선보인 역사소설도 많는데 “소설가들이 과거에 부쩍 열을 올리는 것은 컴퓨터의 사이버 혁명과 상관이 있다.작가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즉 사람들을 과거로 데려가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다”고 토머스말론이란 작가 겸 비평가가 말했다고 뉴스위크는 전한다.
1998-05-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