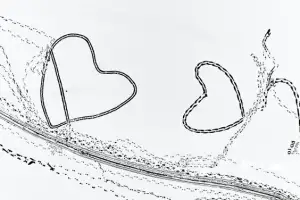한국 오페라 ‘개점 휴업’/기업협찬 줄고 정부지원도 미미
기자
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한국 땅에서 오페라는 공룡이 될까.
한국 오페라가 반백살이 돼 음악인들은 기념축제 갈라 콘서트(18일·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를 비롯,주섬주섬 이벤트를 꾸리고 있다.하지만 ‘축제’란 명칭에 걸맞지 않게 내심 구름이 잔뜩 낀 표정이다.축제란 모름지기 축하 하객이 있어야 빛이 나는 법.잔칫집에 자축,자찬만으로 꾸미자니 웬지 계면쩍은 것이다.
오페라에 관객이 없다.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돈줄이 마른 IMF시대에 그 한계는 치명적이다.하기 좋은 말로 오페라 멸종론까지 나온다.
올해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엔 상반기에 고작 오페라 두편이 오른다.경제한파에 놀란 가슴들이 상황을 지켜보자며 스케줄을 모두 뒤로 미뤄버렸기 때문.한해 합쳐 9편이지만 하반기에나마 살아남을지 유동적이다.우리 민간 오페라단의 수가 서울에만 16개,전국적으로 38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패만 걸어놓고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더 많다는 얘기다.
그나마 상반기 오페라들도 축소하거나 프로를 바꿨다.기업협찬이 안 붙는 상황에서 제작비 압력을 견디다 못한 궁여지책.관객에게 표를 못팔고 협찬 변수에 종속된 한국 오페라는 더이상 자생력이 없다.이번 기념축제 준비위원회에서도 여기저기 손을 벌려봤지만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갹출,무상출연 등 성악가끼리 출혈을 자청해야 했다.
성악가들은 정부의 무관심이 원망스럽다.불황을 맞아 출판과 영화에 거액을 지원한 정부가 오페라엔 너무 냉담한 것 아니냐는 불평.하지만 주변에선 한국 오페라가 살아남으려면 내부의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는다.“한국에도 프로 오페라 가수가 필요하다.저마다 교수자리를 꿰차고 앉아 멋으로 노래하는 한국 오페라는 공연현장과 따로 노는 ‘박제품’에 불과하다”(한 성악인의 지적).뮤지컬이나 연극처럼 ‘팔리는 작품’이 나오려면 ‘오페라가 실패하면 오페라인도 배고픈’ 시장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
한 공연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한국에서 오페라는 교과서의 유물로 전락하기 십상”이라면서 “오페라 ‘시장’이 기능을찾아야 하지만 워낙 악순환이 고질적이라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요원하다”고 우려했다.<孫靜淑 기자>
1998-04-1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