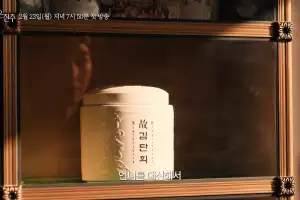입춘… 마음속 잔설은 차갑지만(박갑천 칼럼)
기자
수정 1998-02-04 00:00
입력 1998-02-04 00:00
<노자><장자>(노장)가 생각했던 ‘근원으로의 회귀’가 그의 시정신이었다는(평론가 김우정) 신석정 시인의 ‘입춘’전문이다.유난히도 많은 눈을 흩뿌린 올 겨울이었지만 “겨울이오면 봄은 멀지않아”(셸리의‘서풍에 부치는 노래’)다가와버린 입춘.설사 눈발이 날린다해도 “맨발로 토방아래를 살그머니 내려가고 싶어질”만큼 계절은 봄을 가까이 불러들였다.땅속움들도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것이리라.그같은 꿈틀거림을 보게 된다는데서 ‘보다’(현)의 이름꼴(명사형)‘봄’이 ‘봄’(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최창렬<우리말 어원연구>)
매화향기 속에 햇살은 달착지근해진 듯하나 마음속 응달 잔설위로부는 된바람끝은 차갑다.이른바 IMF한파라는것 때문인가.이런걸 이르면서 춘래불사춘봄은 왔으되 봄같지 않다고 했던 모양이다.이글귀는 왕소군을 두고 지은 시속에 나온다.왕소군은 전한 원제때 궁녀로 절세의 미인이었는데 흉노와의 화친정책에 따라 흉노왕에게 시집가게 되자 뜻있는 이가 그불운을 노래했던것.“그 오랑캐땅엔 풀과꽃이 없으니/봄이와도 봄같지 않다”면서.오늘의 우리들 마음속 입춘도 “남풍이 ×m속도로 불지”않아 싱겅싱겅하다.
어느봄날 영의정 채제공이 말을 타고가다가 어떤집 대문에 쓰인 ‘입춘대길’ 춘련을 보고 발길을 멈춘다.그는 그집으로 들어갔다.집주인인 참판 김로경은 잠시 우두망찰한다.아무 기별도 없이 정승이 찾아들었기 때문이다.더구나 당색도 달랐던 터.채정승은 글씨에 끌렸던 것이다.그춘련을 쓴사람은 나중에 천하명필로 되는 그집아들 추사 김정희.그때 일곱살이었다.채정승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대동기문>)
지금은 거의 볼수없게 됐지만 지난날엔 그와같이 입춘이면 춘련을 써붙였다.복은 들고 액은 나가란 뜻을 담고서.여러 글귀가 있지만 올해는 다음과 같은 대련을 썼으면싶다.‘소지황김출 개문백복래’(뜰을쓰니 황금이나오고 문을여니 백복이 오는도다)
1998-02-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