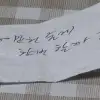‘죽음과 광기의 그림자’ 베른하르트 장편 발간
기자
수정 1997-12-15 00:00
입력 1997-12-15 00:00
‘알프스의 베케트’‘인간 혐오자’ 등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작가 토마스 베른하르트(1931~1989).현대 독일어권 문학을 이야기할 때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그다.그러나 베른하르트는 국내 독자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최근 도서출판 현암사에서 펴낸 베른하르트의 장편소설 ‘옛 거장들’(김연순·박희석 옮김)과 ‘비트겐슈타인의 조카’(윤선아 옮김)는 그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압축해 보여주는 대표작들로 관심을 모은다.
베른하르트 문학의 뿌리는 작가의 유년시절과 청소년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사생아로 태어나 죽음만을 생각하며 불행한 어린시절을 보낸 그는 2차대전의 참상과 자신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외할아버지의 죽음,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게 한 폐결핵에 이르기까지 더없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그의 작품에 온통 죽음과 질병,고립과 광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베른하르트에게 있어 글쓰기란 자아인식을 통해 자신을 구제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도다.그는 삶과 죽음을 대립관계로 보지 않는다.대신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을 통해 삶의 희비극성 내지 인간의 불완전성을 강조한다.
“세상엔 찬양할 것도 없고 저주할 것도 고소할 것도 없다.다만 우스꽝스러운 것이 많이 있을 따름이다.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그는 1968년 오스트리아 국가문학상 수상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곧바로 베른하르트의 문학정신과도 통한다.베른하르트 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서술의 불가능성을 주제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조이스의 작품이나 릴케의 ‘말테의 수기’ 등 현대의 유럽 고전소설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베른하르트의 작품에도 줄거리라고 할만한 것이 없거나 있다해도 간단히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단순하다.베른하르트는 마지막 소설 ‘소멸’에이르기까지 이 창작원칙을 고수한다.자연히 그의 작품에서는 이른바 구성이주는 긴장감은 찾아보기 힘들다.그는 스스로를전형적인 ‘이야기 파괴자’라고 했다.요컨대 베른하르트 문학의 매력은 박진감 넘치는 줄거리에 있는것이 아니라 화자의 자기성찰을 통한 언어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른하르트의 85년작 ‘옛 거장들’의 무대는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사 박물관.소설의 화자인 철학자 아츠바허가 음악평론가인 레거와 만나기로 한 미술사 박물관에 한시간 먼저 가 레거를 몰래 관찰하면서 그전에 레거와 나눴던 대화를 회상하는 내용이다.작가는 레거의 입을 빌어 예술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예술의 ‘거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예술적 속물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이 소설은 베른하르트의 작품들이 으레 그렇듯이 단락이나 절 또는 장 따위의 구분이 전혀 없어 쉽게 읽히지 않는다.때문에 그의 문학을 이해하려면 언어의 음악성이나 언어가 주는 박진감,특히 호흡이 긴 만연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조카’는 현대철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논리 철학 논고’를 쓴 오스트리아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조카인 파울 비트겐슈타인과 작가 자신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이 작품에서 화자로 등장하는 베른하르트는 자신과 파울,그리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을 비교하면서 세 사람을 ‘정신적 인간’이라고 부른다.나아가 파울은 광기를 생활화해 미치광이가 되었으며,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광기를 철학화해 철학자가 되었고,자신은 광기를 통제해 작가가 되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자칫 ‘정신의 감옥’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와 안정을 버리고 치열한 정신적삶의 길을 택한 두 기인을 통해 작가가 그려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김종면 기자>
1997-12-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