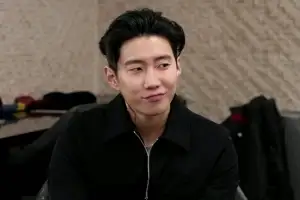장미를 전하고 싶다/이승복 홍익대 교수·시인(굄돌)
기자
수정 1997-08-14 00:00
입력 1997-08-14 00:00
그러고 보니 꽃은 꿈이라는 말이 실감난다.언제였던가 우연히 만난 꽃장수 김씨의 말.그저 장미가 좋아서 시작한 탓이었는지 처음 장사할 무렵에는 가시에 손을 찔려도 손가락에 꽃물이 드는 줄로만 보였단다.하지만 어느새 시절도 15년,한 송이 단가가 300원에서 450원으로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면서부터는 가시에 찔릴 때마다 피멍이 든다며 무뎌진 자신을 탓하던 기억이 난다.하지만 김씨는 지금도 여전히 꽃은 파는게 아니라,꿈꾸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꽃을 사러온 사람은 누구나 꽃으로 대신할 꿈이 있다는 말이었다.
김씨는 자신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꽃은 꿈이라고 말이다.그래서 꽃장사가 잘될 때는 시대도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였다.그 무렵에 신문을 펴보면 풍요롭고 안정되어 있다는게 기사마다 선명하다고 말한다.
난 오늘 신문을 펼쳐들며 김씨의 꽃장사가 요즘 어떨지를 걱정해 본다.학생에게서 받은 것과 꼭 닮은 장미를 몇 송이 사서 여기저기 나누어 주어야 할 판이다.꿈을 주어야할 판이다.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만화를 그리며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싱싱한 공감과 격려의 장미를 전하고 싶다.
1997-08-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