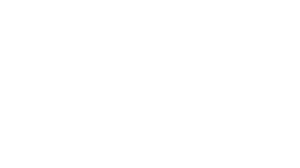시인 고은,새 시집 「어느 기념비」 펴내
기자
수정 1997-04-17 00:00
입력 1997-04-17 00:00
전방위 문필가,마르지 않는 글샘을 자처해온 고은씨가 1백여권이 넘는 자신의 저서목록에 새 시집 「어느 기념비」(민음사)를 보탰다.
새롭게 모아본 시 69편에도 시인특유의 기세는 거침없이 흐른다.국토의 등뼈를 이루는 산맥처럼 호방하게,저자거리의 소소한 인연을 비정할만큼 뿌리치면서 시인은 파천황의 새 세계를 열어제끼려 뚜벅뚜벅 걸어왔다.하지만 지난 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우뚝한 기호로 누구보다 확신에 찼던 목소리는 좀 달라졌다.뜨거웠던 열망이 한풀 가라앉은 이 시대에 우렁우렁하던 목청엔 한가닥 그늘이 드리웠고 신천지를 향한 모색엔 회의가 따른다.
〈간밤 꿈에/나는 아라비아 바다의 한 제독으로부터/새빨간 보자기로 싼 지도를 받았다/남예맨 어디에서였다//이 지도를 펼쳐 보아라/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당장 이 지도의 세계로 떠나라//라는 말을 남기고/그 제독은 등짝에 맞은 독화살의 독이 퍼져 죽었다//떠나라/떠나라//이 지도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구의 고지도나/근대 지도가 아니었다/나는 죽은 제독의 눈을 감겨주고 당장 떠나야 했다//율리시스 20년뒤/내가 도달한 세계야말로/20년전/내가 살던 그곳이었다/그곳 동해 낙산사/그렇다면 나는 결국 가엾은 저 조신이었단 말인가〉(「새로운 지도」중).
자꾸 눈이 흐려져 초발심의 평정한 세계로 이끌리는 시인을 붙드는 것은 국토와 조국에 대한 맹목적 열정이다.늙은 숫사자처럼 시뻘건 햇덩이마저 심드렁할때도 「쓰레기 꽃처럼 피어」있고 「증오가 덕지덕지 똥처럼 말라붙은」(「귀향」중) 구차한 속세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로운 시절의 북소리」(「참여시」중)에 귀 기울인다.<손정숙 기자>
1997-04-1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