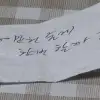뻔뻔한 얼굴들 또 보게 되는가(박갑천 칼럼)
기자
수정 1997-02-16 00:00
입력 1997-02-16 00:00
반반하고 번번한건 울퉁불퉁한 구김살이 없다.물건이라면 제법 쓸만하며 집안으로 칠땐 지체가 높다.그뿐아니다.사람,특히 여성일때 생김새가 예쁘장하다.「반반(번번)한 계집」이라지 않았던가.하건만 그「반반(번번)하다」가 센말로 되어 「빤빤」하고 「뻔뻔」해지면 낯두꺼운 사람을 이르게 된다.좋고 괜찮은 것도 어느 한도를 넘으면 마침내 염치잃는 구나방길로 접어든다는 데서일까.얼굴은 반반한데 하는 짓은 뻔뻔한 사람 적잖이 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
중국 우스개책 「소림광기」에 쓰여있는 얘기 하나.탑삭부리와「내시」가 만났다.『세상에서 가장 굳은건?』 『그야 돌과 쇠지』 『아냐.돌은 깰 수 있고 쇠는 자를수 있으니 굳다할 수 없어.그보다는 자네 얼굴의 수염이 가장 굳지』 『왜?』 『두껍고 딴딴한 자네 낯가죽을 뚫고 나와 자라고 있잖아』.이 말을 들은 수염쟁이는 되받는다.『아니지.자네 낯가죽은 더 딴딴해.그렇게 굳은 수염도 뚫고 못나오니 말야』.뻔뻔하기로 난형난제의 만무방들이었던 듯하다.
얼굴에 쇠가죽 쓴 빤빤뻔뻔한 사람을 철면피라 한다.송나라 손광헌의 「북몽쇄언」에 나오는 진사 왕광원을 두고 한 말이다.그는 한자리 얻어하려고 권문세가를 뻔질나게 드나든다.그러다보니 견디기 어려운 우세도 당한다.하건만 그는 뜬뜬했다.그러는 그에 대해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비쭉거린다.『광헌의 낯두껍기가 열겹철갑과 같다』.그얼굴에 수염은 났던건지 모르겠다.
손광헌같은 사람들아니,「수염도 못뚫는 얼굴」 가진 사람들 좀 많이 봐온 우리 사회인가.까마귀 잔속 훤히 뵈는데 왼 눈하나 깜짝않고 까치배때기같이 구는 지체높은 사람들.「한보」사건은 그런 얼굴들을 우리 앞에 또 한번내비친다.회술레 돌리고 싶은 뻔뻔한 얼굴들이 엮어내는 희곡속에서 괴로운건 자닝스런 백성들.인간사회있는한 그 얼굴은 끊임없이 보게 돼있나 보다.〈칼럼니스트〉
1997-02-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