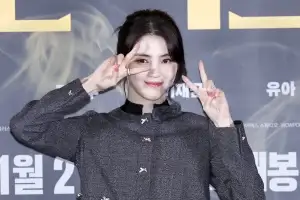「궤변의 국회」/오일만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기자
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특히 지난 12일 본회의장은 궤변이 난무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줬다. 의사진행발언 도중의정사상 처음으로 『존경스럽지않은 선배의원 여러분』이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한 국회를 바라보는 초선의원으로서 솔직한 감정이라는』전제를 달긴 했지만….
순간,야당의원들은 예상대로 『취소해』라는 고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며 장내는 어수선한 『저자거리』처럼 변했다.
『명예』를 생명으로 여겨야할 의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과없이 보여준 현장이었다.
궤변의 논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일 법정개원일부터 국회에서 일관되게 통용되어온 논리이다.
법리논쟁이라는 허울을 쓴 최연장 의원인 김허남 임시의장대행의 산회선포로 야기됐다. 과거 개원때마다 일어난 국회공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법정개정일을 여야합의로 제정했다면 차연장자로의 사회권이양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이후 12일까지 야당은 『유권해석』이라는 엄호물에 기대,국회를 공천으로 이끌었다. 심지어 김의장이 『감기가 걸려 사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명윤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겠다』는 입장표명을 했지만 여전히 등단을 저지당하는 초유의 일이 계속됐다.
마치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상태다』라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소피스트 제논의 궤변학을 그대로 갖다놓은 듯 싶었다.
궤변은 또다른 궤변을 낳게 마련이다. 궤변으로 일관된 말싸움은 결국 국민들의 짜증만을 부른다. 정치는 최소의 비용으로 민의를 파악,원만한 사회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이다. 의원들은 말끝마다 『민의를 대변하는 정도의 정치』를 암송하듯 뇌까리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으로 바뀌어야 할 판이다. 민의가 바라는 정도와는 여전히 거리가먼 행태들의 연속이다. 진정 『큰정치』는 인도의 네루 총리가 설파한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라는 생각이다.
1996-06-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