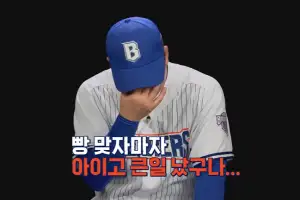(주)삼익 3천억 어떻게 빌렸나/지명도 낮은 지방업체…배경 관심
기자
수정 1995-10-07 00:00
입력 1995-10-07 00:00
지난 2일 부도를 낸 (주)삼익의 전체 여신이 3천1백78억원으로 알려지자 금융권은 일개 지방 건설업체가 이같이 막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대출과정에 비정상적인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금융기관끼리의 상호 지급보증을 뺀 순여신도 담보보다 1백17억원이 많은 2천4백2억원에 이른다.현재 지명도가 없는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은 담보가의 70% 이내로 한정돼 있다.때문에 대출과정에서 모종의 이권이나 압력이 개재됐을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작년 1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삼익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영완씨에게서 해답을 찾고 있다.
김씨는 정부 고위인사의 친동생으로 금융기관에 영향을 행사,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작년 1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삼익의 부채는 1년만에 2천4백1억원에서 3천5백69억원으로 1천1백68억원이나 늘었다.
김씨는 삼익의 부실이 확대되며 더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지난 8월 말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고위인사와의 사적인 모임에 삼익의 제1 대주주인 이종록회장이 배석한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전했다.특히 이번에 부도가 나기 직전에도 삼익의 관계자들이 금융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정부 고위인사의 뜻이라며 1천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공연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기관장들이 부도를 내기 직전까지도 고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장은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당시 천주교 평신도회장이라는 자격으로 노태우 민정당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공로로 6공 당시 관급공사 수주에서 상당한 특혜를 부여받았으며 민정당 서울시지부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후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삼익의 부도는 한양이나 유원건설 무등건설 등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병폐인 권력과의 유착에서 흥망성쇄를 거듭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삼익이 자금난에 몰렸음에도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계속한 것과,부도에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배짱을 부린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이회장이 지난 86년 자신이 설립한 삼익주택·삼익가구·삼익상선이 부실로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돼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삼익을 별도로 설립,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다가 다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점을 들어 금융정보 관리체계상의 허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부실거래처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포함되나 이회장과 같은 실질적인 배후인물은 제외된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부실거래처에 금융부실을 초래한 기업의 실소유주와 금융사고 관련자 등을 포함,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현재 삼익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은 서울은행 8백80억원,주택은행 5백24억원,평화은행 3백27억원 등 13개 은행의 순여신 2천4백2억원(담보 2천2백85억원)과 2금융권 1천2백32억원,회사채 발행 1백34억원 등 총 3천1백78억원이다.
한편 13개 채권은행들은 법원이 오는 9일까지 삼익이 낸 재산보전 신청에 동의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요구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해 동의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우득정 기자>
1995-10-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