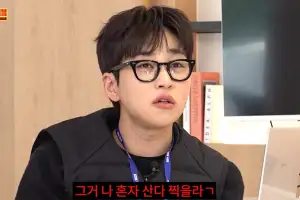아들에게/윤대녕 소설가(굄돌)
기자
수정 1995-01-10 00:00
입력 1995-01-10 00:00
그런데 그 「거룩한 자」의 자식인 나는 과연 어떠했던가.아버지의 기대와 희망을 그야말로 열심히 배반하며 살아왔다.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나도 결혼을 하고 마침내는 자식을 거느린 아비가 되었다.이제와서 나는 부모자식간의 생리랄까 그 모면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 가끔 생각해 보곤 한다.
모든 자식들의 성장이란 결국 제 아비(부모)를 끝없이 배반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기어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는 몸부림 그 자체라고 봐도 옳다.그런 다음 먼 세월이 지나,돌아오기도 힘든 거리에 있게 되면 비로소 내 아비가 내 시작의 전부임을 깨닫게 된다.
아들아,나는 지금 네작고 보드라운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생각한다.내가 그러했듯 너도 이제부터 아버지인 나를 거듭거듭 배반하겠지.그리고 나는 그 배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하겠지.그건 바로 네가 성장해간다는 증거이고 또 네 갈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하지만 이 젊은 아비는 벌써부터 외롭구나.이제부터 너는 떠나기 시작해 내 머리가 희어질 때쯤에나 돌아올 터이니.한데 그건 얼마나 늦은 때인 것이냐.그래,어느 먼 훗날에 너도 나를 조금은 그리워하는 날이 오겠지.그리고 너도 나처럼 아버지 없는 세상을 미리 생각하곤 캄캄하게 절망하게 되겠지.
그러나 부디 너는 네 갈 길로 혼자 가거라.결코 아비가 놓아둔 다리로 세상을 건너지는 말거라.너무 자주 아버지인 나를 배반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1995-01-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