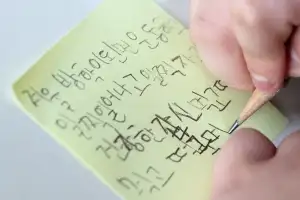눈높이/박내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굄돌)
기자
수정 1993-12-02 00:00
입력 1993-12-02 00:00
『여기가 좀 죽었으니 살려야겠어요』 그곳에 손끝을 갖다대려다 마는둥 하는 그녀의 대답은 으레 이렇다.『아니 여기가 어때서 그러세요.괜찮아요,아니 아주 좋은데요』 그것은 다름아닌 결국 눈높이에서 빚어진 일이다.
세상에서 맞는 여러가지 국면에서 자주 부닥치는 것은 다름아닌 이 눈높이의 차이,다시 말하자면 시각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일이 사실상 많다는 것을 위와같은 단순한 일상적인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눈으로 대상을 본다는 것은 일단 그 대상에 대해 보는 사람의 시각에 기인한다.그래서 그렇게 대상을 인지하게 되고 그 대상을 그렇다고 알게 됨으로써 그 대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조각가가 조각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비록 구상적인 형상성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작품을 인간과의 관계라는 문맥에서 해석할 수 있다.가령 그속에 사람의 평균적인 눈높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던가,한 사람이 포용할 수 있는 일정한 폭을 지녔을 때에 그런 공간성을 가진 작품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높이에 대한 자각은 이와같이 구체적인 대상세계를 파악하는데에도 필요하지만 추상적인 정신세계를 운위할 때에도 비유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 하겠다.우리들이 보는 시점이나 관점이 상대적일 수 있고 더욱이 자기자신이 갖고 있는 시점이나 관점이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본다는 것은 오늘과 같이 가치가 전도되고 질서가 바뀌는 세태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우리 전통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자간의 갈등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시각이며 관점의 결여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993-12-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