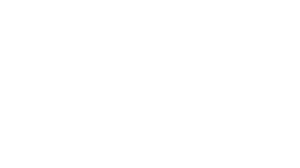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죽지마”외치며 춘도업고 뛰었는데…/김 순경동료 이진광순경의 수기
수정 1993-06-15 00:00
입력 1993-06-15 00:00
『춘도야,정신차려 임마,죽으면 안돼』
등에 업고 뛰기 시작한지 몇발짝도 가지않아 춘도의 몸이 갑자기 축 늘어지더니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불과 1백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병원이 왜 그리도 아득하게 멀리만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었다.
눈물과 땀과 빗물이 뒤범벅된 내 눈에는 병원건물 이외에는 보이는게 별로 없었다.
춘도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힘을 다해 뛰었다.
정신없이 뛰던 길에 길가던 사람과 부딪치면서 언뜻 옆에 있던 여학생이 든 물통이 보였다.
양해를 구할 겨를도 없이 물통을 빼앗은뒤 춘도를 내려놓고 억지로 입을 벌려 물을 흘려넣고 온몸을 주무르다 뺨을 두어번 세차게 때렸다.
『정신차려.제발…』
순간 춘도의 얼굴에 화색이 스쳐가며 특유의 빙긋한 웃음이 보였다.
『어엉,알았어』
하지만 불과 2∼3초뒤 그는 다시 얼굴이 백지장같아지면서 정신을 잃었다.이 말이 그가 이세상에서 한 마지막 말이 될줄이야….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보면서 퍼뜩 「죽음」이란 말이 뇌리를 스쳐갔다.
『안돼,임마』
정신없이 다시 들쳐업고 내달아 청구성심병원 응급실 병상에 뉘어놓은 뒤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낸 문 뒤 속이 타 두개비를 연달아 태웠다.
의사와 간호원의 손놀림 하나,몸동작 하나마다 눈을 뗄수가 없었다.
1시간30분쯤 지난 하오6시쯤 나는 대기버스안에서 친구·형제처럼 지내던 동료의 죽음을 전해들었다.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10여분동안 멍하니 앞만 보고 그자리에 앉아있었다.
갑자기 미치도록 보고싶은 생각이 들어 버스문을 박차고 병원으로 뛰어가 싸늘한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춘도와 나는 지난해 3월 순경공채 1백78기로 경찰종합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 중대에서 같이 지냈다.
말이 별로 없고 맡은 일에는 누구보다 앞정서던 그와 나는 유난히도 붙어다니는 단짝이었다.
1993-06-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