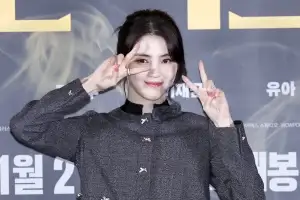원고를 「때리는」 세상이다(박갑천칼럼)
기자
수정 1993-03-17 00:00
입력 1993-03-17 00:00
말은 그렇게 그 뜻을 새끼쳐 간다.아예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같은 방의 동료가 어느 곳과 전화통화하면서 『아침에 나와 원고지 10장을 때렸다』고 소리 높인다.원고를 「쓰는것」이 아니라 「때린다」고 하는데에 말살이의 모습이 비친다.그렇다.이젠 쓰는 시대를 지나 때리거나 두드리거나 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퍼스널 컴퓨터의 보급 따라 그것으로 글을 쓰고 송고까지 하게 되는 세상이다.「때린다」는 말엔 그래서 시대상이 어린다.
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만 글을 쓰는 연모만 해도 그렇다.「붓」(필)의 시대는 지났는데도 글이나 글씨라는 뜻으로 그 「필」자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건필」을 휘두른다느니 날카로운 「필봉」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그것이다.결코 「붓」(필)같지 않은 쇠붙이 펜을 달고 있는데도 「철필」이니 「만년필」이니 했던데서 시대 따라 변화하는 말의 생리를 한번 더 느끼게 된다.
그 쇠붙이로 된 「펜」이란 말은 또 어떤가.오늘에 쓰는 펜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라틴어 페나(penna)에서 출발되고 있다.그 말은 「날개」라는 뜻이다.왜 그런가.서양문화사의 삽화에서 더러 볼수 있듯이 펜은 새(조)의 깃털로써 그 시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가령 독일어에서 페더(Feder)라는 말이 「날개·깃털」과 「펜」을 함께 이르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원고 쓰는 펜에서도 『원고 때린다(두드리다·치다)』같은 변모를 본다.
『날마다 진보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날마다 퇴보한다.진보하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주자의 「근사록」 권2)는 말이 있다.퇴보를 않기 위해 「원고를 때리는」쪽으로 가야겠는데 「기계치」라고나 할까,똑딱 소리와 구상을 병행시키지 못하고 있다.펜으로 써온 오랜 습관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있긴 할것이다.하지만 「진보」를 위해 어색한 채로 「때려」보고는 있다.<서울신문 논설위원>
1993-03-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