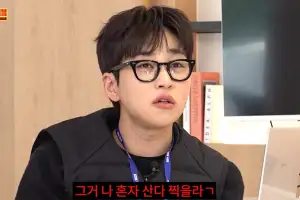지학순주교(외언내언)
수정 1993-03-13 00:00
입력 1993-03-13 00:00
지학순주교가 12일 하느님 곁으로 갔다.그는 「정의가 강물처럼」 「내가 겪은 공산주의」등의 저술을 남긴 사제이지만 이제 「작은 꽃」을 펴내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케 한다.그만큼 지주교는 우리시대가 안은 고뇌의 역정을 살다가 간 사람이다.그의 생애에는 이 시대의 아픔이 투영된다.오열하는 피땀의 자국이 어린다.항상 억눌린 사람의 편에 있었던 사람 지주교.오늘의 우리 사회가 민주발전을 이룩했다고 한다면 그 밑바탕에는 지주교의 외침과 눈물이 깔린다.「작은 꽃」을 펴낼 만하다는 뜻이 거기에 있다.
85년 남북 고향방문단의 일원으로 방북했던 그는 분단후 처음으로 북한에서 미사를 봉헌한 남한쪽 첫 신부가 되었다.그때 그는 누이동생을 만난다.남매는 부둥켜안고 울었지만 누이동생은 옛날의 누이동생이 아니었다.아니,옛날의 누이동생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 입으로 나오는 마디마디는 누이동생의 말이 아닌 체제의 말이었다.『오빤 죽어 천당가겠다니 돌았구먼요』했던 누이동생.지주교는 그 천당으로 간 것이다.
북한을 다녀온 후의 지주교에게서는 온건의 비중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는 투쟁 일변도로는 시대의 아픔을 수습할 수 없다면서 화해를 주장했다.가진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경고도 하고 있다.나만 옳다고 하는 배타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라고 지적한 것도 결국 화해의 정신을 널리 펴나가자는 뜻이었다.
그는 영면하는 순간까지 누이동생과의 해후를 잊지 못했을 것이다.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염원했던 민주발전의 결과로서 탄생한 새정부를 보고서 눈을 감았다.그 점에서는 행복한 죽음이기도 하다.
1993-03-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