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와 사람의 공생 길잡이 ‘아보리스트’
밧줄 하나에 맨몸 맡기고 10m 넘는 나무를 훌쩍
생채기 내지 않으려는 노력, 자생력 불어넣는 마음
최소 4~5년 기다림 끝에 맞이할 생명의 위대함
다시는 무참히 가지치기한 가로수 마주하지 않기를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아보리스트(Arborist)는 클라이밍 장비를 이용해 수목 관리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를 말한다. 우리에겐 아직 낯선 직업이지만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수목 관리가 정체된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들에서는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었다. 결론은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만약 개입이 필요하다면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두절(나무 머리 자르기), 가지터기(가지를 일부 남겨 두고 자르기), 평절(바짝 자르기) 등 가로수 전정 작업은 고사(枯死)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나무의 재생력은 동물의 방식과 다른데 이를 정리한 것이 ‘나무의 부후 구획화 이론’(CODIT)이다. 아보리스트는 이런 해부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수목을 생태역학적으로 관리한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국내 1호 아보리스트 김병모, 트레이닝센터 꾸려
기본적인 이론 수업을 마친 후 밖으로 나가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한다. 오자미를 묶은 로프를 높이 던져 가지에 건다. 족히 10m는 될 만한 높이인데 단번에 로프가 걸린다. 센터 이름인 WOTT(Walking On The Tree Top), 즉 ‘나무 위를 걷는 사람들’처럼 아보리스트는 크레인이나 사다리 없이 로프를 이용해 맨몸으로 나무 위를 오른다. 나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친환경적인 노력이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박윤슬 기자
2022-07-20 20면













![화창한 봄날, 야외 활동이 필요한 이유 알고 보니…[달콤한 사이언스]](http://img.seoul.co.kr/img/upload//2024/04/19/SSC_20240419090712_N1.jpg)
![별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 행성 탄생의 비밀 품고 있다 [사이언스 브런치]](http://img.seoul.co.kr/img/upload//2024/04/19/SSC_20240419104710_N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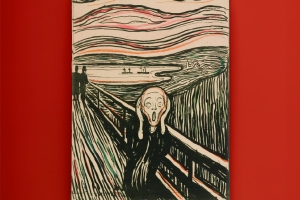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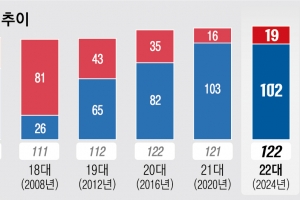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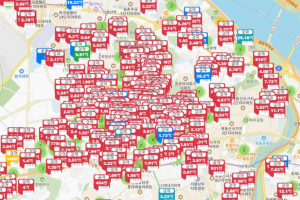

















![미국 맛 가미한 보물 찾기…한국 맛과 다른 백수 아빠[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