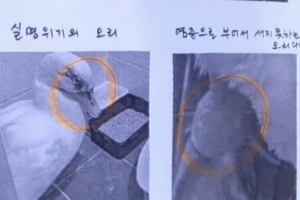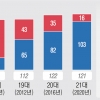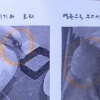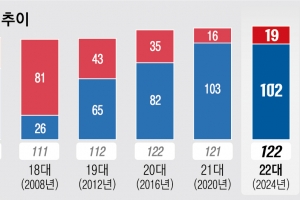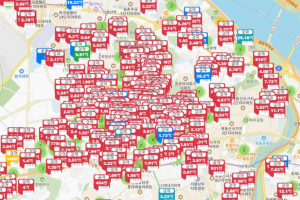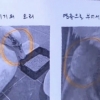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을 때에는 그래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표정을 얼핏 보면서 ‘참 다양도 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 얼굴에서 표정을 읽기가 쉽지 않다. 입을 가리고 있으니 더 그런 것 같다. 그러다 착각일지 모르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순간 움츠러든다. 이럴 때면 어쩐지 조커가 떠오른다. 입꼬리는 올라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어 슬퍼 보이는 조커.
사람의 눈은 참 많은 표정을 담고 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초조함도 비아냥도 무관심까지도.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서 점점 표정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진다. 표정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마스크와 함께 주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걸까. 그럼 사정이 나아져 마스크를 벗으면 예전의 표정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눈뿐 아니라 입까지 웃는 진짜 표정 말이다.
2020-08-1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