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일은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여겨지는 공직 사회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비리와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는 점이다. 위로는 장관에서부터 아래로는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권의 몰락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에 일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세종청사 모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집단의 방관과 침묵이 결국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이 관련 부처를 통할하고 지휘해야 할 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간부들까지 국정 농단에 알게 모르게 개입하거나 비위에 눈을 감고 때로는 부역의 총대를 멨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난 이후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괴와 자책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장관이 국정 농단의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형국에 이르러서는 공직이 어쩌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술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또 다른 공무원은 “하루하루 늦은 밤까지 힘든 일과에도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버텨 왔는데 부끄럽고 괴로워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닐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잘못을 지적하고 협조를 거부하다 끝내 버티지 못하고 조직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도 있다. 진작에 이들과 그 주변에서 용기 있게 시시비비를 공론화하거나 비위의 조짐을 바깥으로 알리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 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비단 일부 부처만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각종 정책이 수요자인 국민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공직자 모두가 곰곰이 되새겨 볼 일이다. 관행처럼 또는 암묵의 카르텔처럼 소수의 대기업이나 재벌, 특정 이익집단의 입김에 시달리고 뒤틀리는 정책 사안들이 없는지, 그래서 공직 사회가 또 다른 국정 농단 사태에 휘말릴 여지는 없는지 곱씹고 또 곱씹어 봐야 한다.
공무원 헌장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공익 우선과 투명성, 공정성, 청렴의 생활화,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른 행동을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로 제시하고 있다. 굳이 공무원 헌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2·제3의 부역의 오명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현재의 공직 문화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과 무사안일 풍토가 공직 생태계를 좀먹고 고사시키는 내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소통의 빈자리에 상명하복이 자리잡고, 실적과 근무평가 위주의 경쟁 체제가 개인의 소신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현재의 공직 문화로는 진정한 공복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만시지탄이지만, 뼈아픈 자성이다.
ckpark@seoul.co.kr
2017-04-27 3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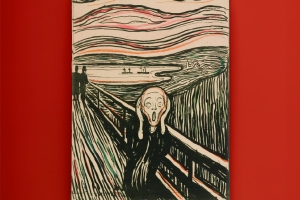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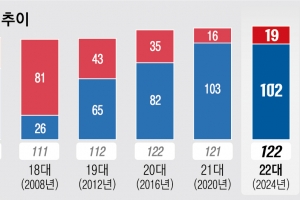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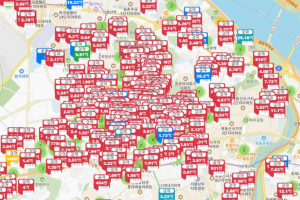

















![미국 맛 가미한 보물 찾기…한국 맛과 다른 백수 아빠[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